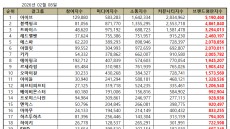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가난이 가정폭력?](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4300837370689446a9e4dd7f121162186166.jpg&nmt=30)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변변하게 해 준 것 없는 나 같은 부모 입장에선 섬찟한 글입니다. 반박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적지 않은 네티즌이 공감을 표하며 여기저기 퍼 나르고 다른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했습니다. 심지어 이 의견에 동의하는 소수의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낳음당했다’는 말로 조롱하거나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면서 애를 낳는 건 죄악’이나 ‘낳음당했다’는 표현은 모두 가난한 부모를 향한 원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단지 ‘부모 잘만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끼리 하는 ‘계급통 느낀다’는 자조적인 말도 이 때 생겨났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은 대략 2010년쯤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만 해도 계급론은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회에 반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었습니다.
불합리한 ‘꼰대문화’와 디지털 기기를 쥐고 태어난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도,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냉소하는 분위기도 이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계급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자신의 낮은 계급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증’이나 ‘고통’이 포함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도 더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와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난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녀를 생산할 자격도 없다는 정서가 대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박탈감은 구조를 지적하는 계급론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계급통이 되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렇게 된 것의 책임을 어떤 사람은 정치를 탓하고 다른 사람은 성숙한 시민의식 문제로 돌리는가 하면 첨단 과학기술로 해결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계급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데 어떠세요?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