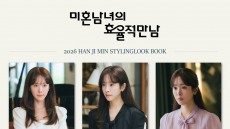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한다. 해당 서면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만약 2개월 내에 답을 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
만약 토지 소유자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시가 상당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처지에선 일정 지연을 막는 합리적 방안이나,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 OOO구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피고 측은 사업시행자 측의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을 찾았다. 당시 피고 측이 공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새로운 공유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음에도, 일부가 전 공유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를 포함한 새로운 공유자들이 원고의 신탁업자 지정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사 측은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소송을 전담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등기부상 문제점을 밝히면서 피고들이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청구가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과 피고 측이 원고의 신탁업자 지정에 적법하게 동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며 “이를 통해 해당 등기부는 경정되었고, 피고를 포함한 새로운 공유자들의 원고의 신탁업자 지정에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밝혀 매도청구권 자체를 취하시키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매도청구소송은 일방적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한이기에 회답 촉구의 상대방과 절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대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부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