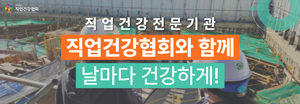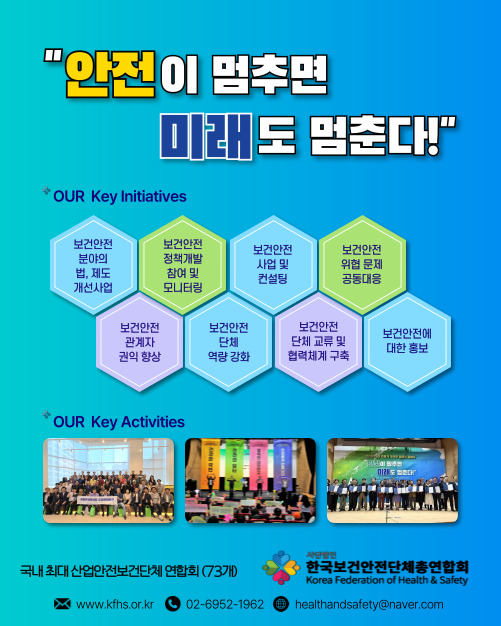강제집행은 건물명도를 목적으로 채무자 점유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면서 이때 채무자도 함께 내보내어 그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도록 인도하여 그 절차가 종료되는데 이에 따라 확정판결문의 집행권원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집행력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집행 종료 후 채무자가 다시 들어와 거주하더라도 강제력을 동원해 내쫓거나 종전 확정판결문의 집행권원에 의한 재집행은 불가한하기 때문에 새 확정판결문의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따라 건물명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해 불법 점유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채무자, 전 소유자 등 강제집행을 받은 채무자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받은 자의 가족이나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 제3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에 의해 건물명도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면 그 집행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집행 후 임차인이 다시 들어왔더라도 같은 집행권원으로는 다시 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다시 내보내려면 새로운 확정판결문의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하나 병행적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볼 필요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건물명도 강제집행은 대부분 점유권리를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퇴거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점유자나 관련자들의 저항으로 인한 불측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조력 하에 단계별로 대응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