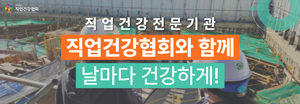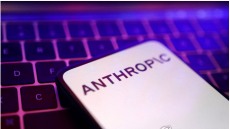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조용한 퇴사’를 보는 시각](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9260805550215846a9e4dd7f220867377.jpg&nmt=30)
그러면 나 같은 기성세대들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진짜 요즘 MZ들은 단지 책임감이 부족한 게 이유일까요. 안정된 공기업을 다니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실망하고 연봉도 훨씬 높은 사기업으로 이직한 한 젊은이는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공노비에서 사노비로 신분만 바뀐 거죠.”라며 냉소적으로 말하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분명합니다. 맡은 일을 최소한으로 해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애써 봐야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내 자리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가 일반적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용한 퇴사’는 진짜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어진 일 이상은 하지 않겠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오늘 할 일을 나는 끝냈으니 퇴근하겠다’ 같은 사고방식은 나태해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한 겁니다. 특히 권한 없이 책임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스스로를 ‘노동력 파는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런 태도는 조직은 물론 개인에게도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는 거라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스스로 성장하는 성취감이 없을 때 개인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개인과 조직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직원이 자기 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조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령 팀의 목표를 정할 때부터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업무방식과 순서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경험 같은 것으로요.
자신의 의견이 조직에서 영향력이 있고 성과를 창출해 본 경험은 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회사의 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맡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은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한 평가와 결과가 개인의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런 신뢰가 쌓일 때 직원들은 노력할수록 인정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론은 ‘조용한 퇴사’는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할 일입니다. 이건 AI가 할 수 없습니다.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