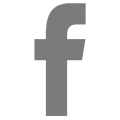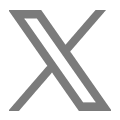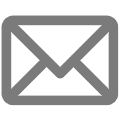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오역하는 말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11140800430614746a9e4dd7f220867377.jpg&nmt=30)
최근에 읽은 번역가 황석희의 《오역하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번역은 필연적으로 오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수긍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영화번역을 주로 하는데 (번역)업계에서는 2%까지는 오역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보통 영화 한 편에 1500개 정도 자막을 쓰는데 2%면 30개입니다. 그 정도는 좀 틀린 게 있어도 눈감아 준다는 뜻입니다.
번역은 동물로 치면 서로 다른 종, 예컨대 기린과 펭귄이 서로 소통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종끼리의 소통은 문제가 없을까요? 오해 없이 모든 걸 다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It feels good!’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기분이 좋네’ ‘와! 기분 죽인다’ ‘짱 좋아’ ‘와, 째지는데…’ 등등 다양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또 어떤 백그라운드(학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를 가졌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뒤 맥락은 물론 시대상황, 그 사람의 환경, 듣는 사람 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출발어 ‘It feels good!’이 도착어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히 창작의 영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텍스트만 보면 ‘It feels good!’이라고 했는데 자막은 ‘죽이는데!’라고 했다고 오역이라고, 번역가가 엉터리라고 시비 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역하고 싶은 번역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오역이 나오게 됩니다. 기술번역이나 정보를 옮기는 경우는 다르지만 문학이나 예술영역에선 텍스트만 옮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옮기려고 했는데 오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오역하기로 마음먹은 ‘의도적인 오역’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역과 정역의 경계도 사실상 모호합니다. 타인의 말과 세상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오역(오해)하는 건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상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과 달리 글은 문장 하나하나가 문법적으로 완결된 형식을 갖춰야 하고 의미가 명료하게 살아야 합니다. 글을 읽는다는 건 타인의 사유를 따라 걷는 일이며 그 길에서 자신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침일기’도 내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내 책임일까요, 그 사람 탓일까요?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