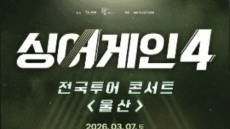부부는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원은 경제활동과 같은 직접적 기여 외에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역시 간접적 기여라고 보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전업주부의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면서 혼인 기간과 비례하여 기여도를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분할 대상 특정 하는 일이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판례에 의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되 기여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특유재산 취득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포함여부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25년 차 부부에게 2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 한 채와 1년 전 상속받은 상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상대방은 2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지만, 1년 전 상속받은 상가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한다. 1년 전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게 된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배우자의 퇴직금과 노령연금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노령연금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최근 혼인 기간이 더 짧아도 연금분할을 신청할 있게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반면,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특혜를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부부가 협력하여 신혼집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신혼집 마련 과정과 대금 정산, 인테리어 비용 등에 따라 신혼집을 마련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 외에도 배상적, 부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혼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은 기여도 입증을 위한 주요 수단이자 근거이다. 하지만 재산형성 기반이나 과정, 각자의 노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혼인 기간과 재산형성 과정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