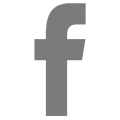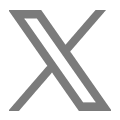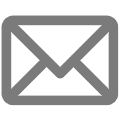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시를 쓰고 싶었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8190812580374446a9e4dd7f220867377.jpg&nmt=30)
내가 경험한 연애들(?) 혹은 문학 미술 영화에서 본,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서 막연하게 상상한 연애들을 아무리 열심히 떠올리며 써도 연애시라기엔 뭔가 찜찜했습니다. 나한테 연애감정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성북동 길상사에 갔다가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봤습니다. 백석은 윤동주가 너무 닮고 싶어서 시집 《사슴》을 필사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은 당시 시인들의 시인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는 지금의 길상사를 있게 한 김영한 씨와 연인이었을 때 백석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내가 쓰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가난한 내가 /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 어데서 흰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비지땀이 뚝뚝 떨어지는 한여름인데도 시를 읽으니 나는 곧바로 눈이 ‘푹푹’ 쏟아지는 어느 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길상사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는 백석과 나타샤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걸 시로 쓰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영화나 소설, 하다못해 만화 속 주인공들은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사랑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와 갈등은 언제나 사랑 때문에 벌어졌고 다시 사랑으로 해결됐습니다. 모든 위기가 사랑으로 극복되는 세계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힘찬 용기였습니다.
어렸을 적 나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도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은 순수했고 그런 사랑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오래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석의 시를 읽고 나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타샤’에 대한 성실하고 애틋한 사랑이 ‘푹푹’ 내리는 눈이 되었듯이 마음 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말들을 붙잡아 뭔가 말이 되게 쓸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날 자괴감에 빠진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넘보지 말고 할 줄 아는 거나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