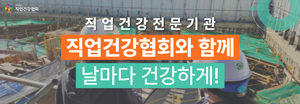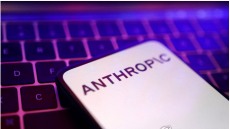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실력과 시험점수는 상관이 없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9240802300612346a9e4dd7f220867377.jpg&nmt=30)
왕년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라면 이와 똑같진 않아도 자신만의 요령 한둘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토익학원의 ‘일타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영어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필요한 건 토익점수지 영어실력이 아니다.” 강사는 ‘의문부사로 시작하는 질문이 나오면 보기 중에서 ‘Yes’나 ‘No’로 시작하는 답은 제외하라’는 식으로 요령을 알려줍니다. 수강생들의 점수는 짧은 시간에 훌쩍 오릅니다.
진짜 실력은 원래 실전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지원자가 영어로 대화하는 실제 상황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시험입니다. 시험 결과로 실력을 가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지원자 입장에선 실력보다 시험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 말고 시험공부를 하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결국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선 시험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험제도는 대부분 시험성적이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혹은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요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는 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에 1%씩 하락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20년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된 기술을 베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20년 안쪽으로 들어오자 더는 베낄 게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것(First mover) 외엔 방법이 없어진 것이지요.
AI시대에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시험은 창의성 높은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문제와 과학문제를 잘 풀게 하는 게 교육목표인 학교와 학원, 사회에선 희망이 없습니다. 공부 말고 시험 잘치는 요령을 익히라는 조언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교육기관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고 그런 선택을 하는 개인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문제와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