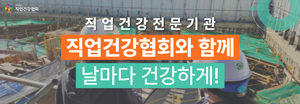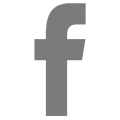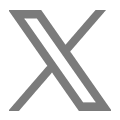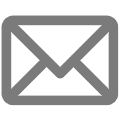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장례식](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8090826530345246a9e4dd7f492541784.jpg&nmt=30)
그런데 솔직히 말해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상을 당한 자식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OO이는 XX와 친했으니까 장례식에 오겠군. 오랜만에 BB를 만날 수 있겠는 걸’ 따위의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비교적 덤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 온 친구들도 비슷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형식적으로 조문하고 빈소 옆에 마련된 식당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아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합니다.
문상객이 좀 한가한 틈을 타 상주와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 고인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주는 아예 자주 묻는 질문(FAQ)를 만들어 테이블에 올려 놓을까 고민할 정도입니다. 간단한 대화가 오간 뒤 상주가 다른 조문객을 맞기 위해 자리를 뜨면 친구들은 다시 왁자지껄 떠들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장례식장은 동문회장이고 향우회장입니다. 애도와 위로가 오가는 동시에 만남의 장이고 다른 한편으론 허세의 장이기도 합니다. 빈소 안팎에 놓인 화환이 얼마나 많으며 누가 화환을 보냈는지 살피게 됩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고인이 아니라 상주의 위세를 드러내는 경연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장례의식은 종교와 상관없이 대체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능한 많은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여러 의식과 절차를 통해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족들은 복잡한 장례절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불필요하고 왜곡된 절차로 상주뿐 아니라 문상객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용을 많이 들일수록 효를 다하는 거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조용하고 합리적인 애도의식을 치르려면 관행과 격식을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면 불효라고 여기고 거창한 장례식으로 상주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풍토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식 세대에까지 불합리한 전통과 관행을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