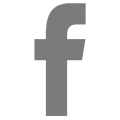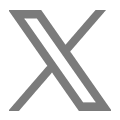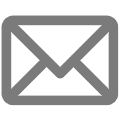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아이의 시간, 어른의 시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7030816110729046a9e4dd7f220867377.jpg&nmt=30)
“영감님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구요”
“넉점 반이다”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 닭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 물고 니나니 나니나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 반이래”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이 1940년에 쓴 동시입니다. 기억력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닌데도 어렸을 적 깔깔대며 읽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해방도 되기 전이며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 짓던 시절입니다. 오후가 되면 엄마는 슬슬 저녁밥을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 시계가 없으니 시간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가게에 가서 지금 몇 시나 됐는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게 영감님이 “넉점 반”이라고 알려주자 아이는 잊을세라 “넉점 반, 넉점 반”을 반복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집 가는 길에 물 먹는 닭을 한참 구경하다가 먹이를 옮기는 개미 떼를 발견하고는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들여다봅니다. 잠자리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예쁘게 핀 분꽃을 따서 입에 물고 해가 꼴딱 질 무렵에야 느릿느릿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엄마, 시방 넉점 반이래”
엄마의 어이없는 표정과 심부름을 ‘완수한’ 자신을 스스로 대견해 하는 아이의 모습이 눈 앞에 그려집니다. 세상 온갖 게 장난감이고 온 동네가 놀이터이던 시절, 시간은 참 잘도 흘렀습니다. 호기심 닿는 곳을 따라 헤매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숏츠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동영상에 빠져 마음이 메말라버린 요즘과는 차원이 다른 ‘순도 높은’ 시간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몰입한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하며 효율을 따지고 행여 시간을 낭비할까 조바심하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만 살다 보니 가끔은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나만의 ‘넉점 반’이 그리워집니다. ^^*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