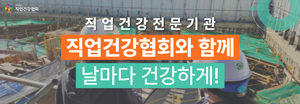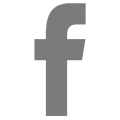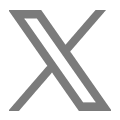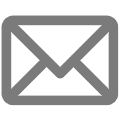박술녀는 “외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박술녀”라며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앞을 못 보셨다. 시각 장애인이셨다. 태어나셨는데 강아지가 눈을 핥아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술녀는 "그 고생이 얼마나 컸겠냐.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것을 못봤다. 글씨는 모르지만 세상 이치는 그렇다고 하셨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서당에 동생을 업고 가서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했었다"고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jbd@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