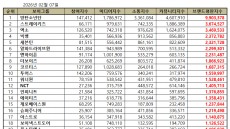![[신형범의 千글자]...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7101515120556346a9e4dd7f1822257147.jpg&nmt=30)
우선 사회성 높은 사람이 AI를 잘 씁니다. 여기서 사회성이란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성을 흔히 사교성과 착각하기 쉬운데 둘은 다릅니다. 사교성은 넓은 인간관계, 낯선 사람과 즉흥적인 상호작용을 편하게 여기는 성향입니다. 재미있는 건 사교성만 높은 사람은 AI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인간관계에 신중하고 섬세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AI를 다룰 때도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 조금씩 풀어갑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처음 대화할 때처럼. 반면 사교성 중심의 사람은 AI에게 바로 답을 달라고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이 기대에 못 미치면 AI를 탓하기도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향이 AI 활용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고위 직급자가 하위직보다 AI를 잘 못 씁니다. 평소 부하직원에게 대충 말해도 결과물이 나오는 환경에 익숙해서입니다. 하지만 AI는 직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하직원처럼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설명이나 요청이 엉성하면 결과물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 직급자는 AI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그동안 자신이 내린 애매한 지시를 부하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해석하고 처리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자신의 역량, 리더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애매한 지시, 즉 엉성한 프롬프트에도 찰떡같이 이해하고 해결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공계 전공자가 AI를 더 능숙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문사회계열, 특히 철학이나 어문계열 전공자가 더 유연하게 잘 다루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학, 자연과학 전공자는 AI 활용빈도와 친밀도는 높지만 명확한 결과를 기대하며 AI의 비결정적이고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답변을 답답해 합니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해력 같은 인지적 과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이들은 반복되고 섬세한 토론, 열린 질문에도 익숙합니다.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맥락을 쌓아가며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사회성 높은 인문사회계열의 하위 직급자가 AI를 가장 잘 활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관찰이 의미가 있는 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반드시 기술지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고 맥락을 짚고 성실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AI를 다루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AI시대에 중요한 능력은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것보다 섬세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또 단순히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서도 적용되는 능력 아닌가요? ^^*
sglee640@beyondpost.co.kr